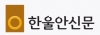1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의 낮은 담’을 사이에 두고 악수했다. 곧이어 1953년 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으로 분단된 두 나라에 절대적 ‘그 너머’였던 군사분계선을 북으로, 남으로 한 발짝씩 함께 넘는 모습이 전 세계 기자들의 카메라에 담겼다. 2017년, 2018년 한반도는 원불교인들에게는 더욱 첨예한 이슈인 성주성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던 시기였다. 그 이전까지 남북 정상이 첨예한 대립의 장소이자 동시에 공유의 장소인 DMZ에서 만난 적은 없었기에 두 정상의 만남에 더욱 주목했다.
1년이 흐른 그사이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 진전이 멈췄지만, 정부는 지난 4월3일, 관계부처·지자체 합동브리핑을 열어 ‘DMZ 평화 둘레길 개방 계획’을 발표하는 등 냉전을 종식하기 위한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처음으로 DMZ가 민간에 개방되는 것이다. 전 세계 최후의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다시 어떤 물살을 탈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물결을 우리는 물론 전 세계가 이미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격변하는 한반도 평화의 바람을 가장 갈망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 관계자? 증권가? 개성공단 관련 사업체? 접경지역 주민들? 물론 이들 역시 남북관계의 진전을 간절하게 소망하겠지만 경제적 이해관계 없는 실향민이나 북한 이탈 주민들의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실향민들은 세월이 흘러 기억이라도 희미해진 측면이 있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는 너무도 생생한 아픈 기억들이 온전히 남아 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돌고 돌아 짧게는 한 달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다.
부끄럽게도 필자는 지금까지 분단 문제를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다. 초미의 관심이 쏠린 북한 핵 너머, 정치적 이슈 너머, DMZ 너머, 그곳에 사람이 있다. 그곳에 떠난다고 말도 못하고 떠나온 친구와 엄마가 있음을, 그곳에 사심 없이 뛰어놀며 꿈을 키우던 고향이 있음을, 그곳에 삶의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한겨레가 있음을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한다.
원불교와 인연을 맺고 올해로 개교 14주년을 맞이하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북한에 있는 친구, 가족, 친지들에게 쓴 손편지, 어둠을 밝혀줄 태양광 랜턴, 꽃씨를 보낸다. 원불교환경연대와 둥근햇빛협동조합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특정 도시를 제외하고는 전기 사정이 아직도 좋지 않아 어두운 밤길을 걷다 길을 잃고, 밤에는 책을 읽을 수 없었던 기억을 떠올려 태양광 랜턴을 만들었다. 함께 쓴 편지에는 남겨진 가족에 대한 미안함,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 기억이 사라지는 두려움, 평화통일의 희망, 다시 꼭 만나자는 학생들의 바람이 오롯이 담겼다. 한겨레중·고등학교 편지, 인터뷰, 북한 사회·경제·문화 정보를 담은 책을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앞두고 <우리 북동네 잘 있니?>라는 제목으로 출간한다.
책을 만들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있었음을 깨닫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왜 우리와 매우 다르다고 느꼈을까. 처음에는 구조적으로 알 수 없었거나 잘 몰랐기 때문이라며 자기변명을 했다. 아니다. 어쩌면 그보다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무관심이었다는 반성을 했다. 학생들이 손으로 쓴 편지를 읽으며 2019년의 이 사월의 봄날, 북한 주민들도 남한의 우리의 일상처럼 학교와 직장에 다니고, 장사하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이 북한 이탈 주민이면서 한겨레중·고등학교 부설 남북청소년교육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인 고선아 선생님은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라는 것을 남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북한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북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너머, 그곳에 사람이 있다.
고 박완서 작가의 문학적 시원은 스무 살 시절 겪었던 한국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픈 역사에 대한 먹먹한 그녀의 말로 마무리한다. “어쩜 그렇게 혹독한 추위, 그렇게 무자비한 전쟁이 다 있었을까. 이념이라면 넌더리가 난다. 좌도 싫고 우도 싫다. 진보도 보수도 안 믿는다. 김훈의 말을 빌리자면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 다만 바퀴 없는 자들의 편이다.”
/ 책틈 편집장, 서울교당
04월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