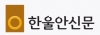서울교사회장
“왜 매번 글을 이렇게 길게 쓰는 거야? 읽는 사람 생각해서 좀 짧게 쓰면 좋으련만.” 입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유난히 긴 글을 쓰는 다른 사람에게 질러버린 댓글 하나로 단톡방은 결국 사단이 났다. SNS상의 표정 없고 억양 없는 글은 때로는 왜곡되게 전달되어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위와 같이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사실 SNS는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지구 반대편, 밤낮이 달라 즉각적으로 전화를 할 수 없는 이국땅의 친구에게도, 심지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또 글로 전달하기 어려운 섬세한 감정 표현까지, 원하는 이모티콘에 손가락만 대고 단 한번의 클릭으로 가능하니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맞아 맞아, 아하 그랬구나. 나도 같은 생각^^’ 등 공감의 댓글을 자주 올리는 사람은 누구라도 좋아하지 않겠는가. 반대 의견이나 비판적인 댓글은 혹시라도 거친 논쟁으로 번질까 봐 다른 사람들은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게 된다. 정치적·종교적 성향이 강한 댓글을 쓰거나 그런 류의 글을 퍼 나르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인 성토를 당하거나 ‘쌩’하니 밴드나 단톡방을 나가면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남들은 그다지 관심도 없는 자녀 이야기에 사진까지, 또 자신만이 알고 있는 지인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도 있다. 보는 사람들이 지루해서 하품하는 줄도 모르고. 하지만 서서히 조회수가 줄어들고 댓글이 뜸해진다는 것을 조금만 신경쓰면 단박에 알게 된다. 댓글은 쓰지 않은 채 눈으로만 글을 훑어보는, 소위 말하는 ‘눈팅’도 있다. 이렇듯 각양각색의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우리는 그들의 글을 통해, 또 글의 행간을 통해 그들의 마음과 감정의 상태를 읽어낸다.
그런데 댓글은 예전에는 없던 사회적 현상과 신조어를 만들기까지 한다. ‘댓글의 역설’이 그것이다. 이것은 공론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댓글이 악성으로 치달으면서 지식인의 자기검열을 과다하게 초래하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현상을 말한다.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상대방을 비방하고 거침없는 막말과 욕설까지 이어진다. 심지어 글을 쓴 당사자는 가족의 신상털기까지 집중포화를 받게 되면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다.
필자는 글의 논리성, 합리성, 시의적절성 외에 예상되는 악의적인 댓글까지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다보니 소신 있게 글쓰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혹시 누가 내 글에? 하는 불안한 마음에 소심한 글쓰기와 자기 글에 대한 검열이 불필요하게 많아진다. 따라서 당당한 입장 표명이나 합리적 비판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글의 주제를 선정할 때에도 망설이게 된다. 예민한 주제를 피하고 유연한 주제만을 골라 그나마도 공격받지 않을 만큼 요리저리 피해서 글을 쓴 글, 논점도 없는 밋밋한 글만이 온라인상에 살아남지 않을까 염려된다.
다수의 소심한 사람들이 조용히 침묵하면서 눈팅만 하는 분위기를 틈타 표현 수위의 도를 넘으면서까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하는 댓글자들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증명되지 않은 의혹까지 무분별하게 제기하면서 ‘아님 말고’ 식의 무책임한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과격하고 폭력적인 댓글 공격에도 ‘난 괜찮아’를 연발하는 강심장만이 글쓰기 전선에서 살아남는다면 이 얼마나 우울한 현실인가. 사실 따지고 보면 상처받지 않는 강심장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정말 그가 그렇다면 그는 감정이 없는 냉혈한이거나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비사회적인 사람일 것이다.
예의와 도덕이 요청되는 것은 당연하다.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물리적 규제를 통해서라도 엄정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걸러지지 않은 감정들이 제멋대로 배설되는 통로로 댓글이 활용되는 것을 용인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8월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