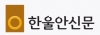치매를 앓고 계신 팔순의 아버지는 자신과 가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대부분의 자아를 상실한 채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신다. 아마도 익숙한 골목길이 있는 마을로 돌아오시지 못하고 병원의 작은 침상에서 이생을 떠나실 현실에 아픔이 몰려온다. 그럼에도 손을 번쩍 들어 용감한 돌봄의 주역이 되겠다는 용기를 쉽사리 낼 수가 없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6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현대인을 압박하는 사회경제 문화 키워드 중에 100세 시대의 공포와 불안, 부담감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쉴 새 없이 분출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균수명 100세 시대는 내 시대에 다가오지 않을 먼 미래의 일 같았으나, ‘재앙’이라는 표현으로 눈앞의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도달했다. 어쩔 수 없이 살아남을 것인가, 존엄하게 살아갈 것인가. 생의 한가운데서 이제는 냉철한 고민을 마주할 때다.
서울 집들의 중간 집값이 2019년 11월 현재 8억 7천만 원이라는 관련 기사를 읽었다. 나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단지 막연하게 유기농 먹거리, 값비싼 영양제와 건강검진, 지금도 버거운 보험을 더 가입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이 정도는 있어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노후자금 준비에 현실을 저당 잡힐 것인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인 상황에 절망하여 수저 운운하며 부모를 원망하고 자괴감에 빠져 허우적거릴 것인가.
최근 몇 달간 필자는 사는 마을에 대해 고민했다. 물질적 자산도 중요하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정신적 자산이다. 끝까지 나답게, 자기다움을 지키며 살다가 아는 얼굴들 사이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을에서 나이 드는 것을 꿈꾸고 싶었다. 나는 어떤 삶의 주거환경, 공동체 환경의 울안에서 나이 들고 질병을 앓으면서도 친밀한 이웃들과 상호 교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주 때마침 8년여 전 협동조합 창립 초기부터 조합원으로 참여한 마을의 의료생협에서 관심사에 딱 맞는 강좌가 있어 참가했다.
<나이 들고 싶은 마을>이 대주제였다. 자본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두에게 이 사회는 불안하고 지속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나이 듦, 빈곤과 질병이라는 두려움의 악순환하에서 고립되는 삶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존적으로 명확하게 두려워하자는 메시지였다. 스스로 함께 나서서 추상적인 두려움에 지지 않겠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움직여 마을이 달라지면 모두가 안심하며 사는 지속 가능한 마을, 여러 겹의 관계망이 동심원이 되어 퍼져나가는 마을이 되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다.
자연과 타인에 대한 호혜적 의존과 순환은 순조롭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결국 사은 즉, 은혜의 관계로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끝까지 존엄할 수 있는 마을, 자신을 비롯하여 소중한 사람이 짐이 되지 않는 사회, 인간으로서 삶의 본질에 가장 근접하려는 생태적이며 존엄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이 되려면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자기 성찰이 우선해야 한다.
100년 전 소태산 대종사의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선언이 100세 시대인 지금, 여기서 나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은혜로운 관계 맺기를 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시대의 철학과 화두로 되돌아 우리 앞에 서 있다.
11월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