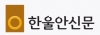가을에서 겨울로 넘어오는 8주 동안 월요일 밤마다 만나온 사람들이 있다. 서로의 얼굴도 이름도 하는 일도 어떤 생의 시간을 살아왔는지도 어떤 취향을 지녔는지도 몰랐던 이들이 만났으나 여느 모임과 달리 성급하게 묻지 않았다. 느리고 농밀한 시간들이 가을 낙엽처럼 천천히 그들의 곁에 쌓여갔다.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의 남겨진 자로서 어느 날, 순식간에 삶이 납작해진 사람들이 모였다.
8년 전 동생을 자살로 떠나보낸 필자는 OECD 국가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의 그 흔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늘 궁금했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몇 년에 걸쳐 다양한 플랫폼에서 쓰고, 말하며 쌓아간 발화(發話)의 언어들을 그러모아 애도 에세이 <서둘러, 잊지 않습니다>를 출간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는 왜 자살 유가족의 애도에 이렇게도 무지하고 인색한가. 자살 유가족이라는 상처는 숨기고 납작하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시지프스의 형벌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반복되는 이 모퉁이를 어떻게 돌 것인가. 날벼락 같은 사건이 지나간 구덩이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오기 위한 절박한 필살기가 필요했다. 도시를 삼키는 땅 꺼짐 현상처럼 일상을 삼키는 커다란 싱크홀을 마음에 남긴 자, 자살 유가족들은 도저히 메꿀 수 없을 것 같은 그 구멍을 자신의 서사로 활자 계단을 만들어 밟고 올라오고 싶어 했다.
그 만남의 연결선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자살 유가족 글쓰기 동아리’였다. 8주간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 필자도 동료 유가족 멘토인 상처받은 치유자(The Wounded Healer)이다. 세상이 뭐라 말해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냈을 고인을 이제는 존중하고 싶어 했다. 더불어 남겨진 저마다의 삶이 사려 깊지 않은 타자에 의해 함부로 왜곡당하도록 가만히 놔두고 싶지 않았다. 저마다 자신의 언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펙트(Respect, 존중)를 절실하게 원했다.
Respect는 다시, 뒤로(Re)라는 뜻을 지닌 접두사와 쳐다보다, 바라본다(Spect)라는 의미의 어근이 만나서 존중(Respect)이라는 단어로 전환된다. 이 글쓰기 과정에서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제시했던 열쇳말은 ‘자신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존중’이었다. 애도(哀悼)는 상실을 다시 ‘봄’이다. 그렇다, 다시 정면으로 보며 참혹한 고통으로부터 자신과 타자를 천천히 함께 세우는 것이다. 혼자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함께 걷는 도반이 있는 순례길이었다. 직면하는 글쓰기를 통해 저마다 자신을 주체적으로 추동해야 했다. 필자는 그들의 추동을 이끌어내며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할 뿐이었다.
타자의 이야기는 어느새 자신에게로 옮겨와 역지사지하며 자신의 고통과 함께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시간을 건넸다. 서로에게 개입하고 참조하며 연결되어 서서히 리부트(Reboot)됐다. 사은(四恩)의 은혜는 어디서든 사무치도록 흘러들었다. 저마다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활자들은 존중과 돌봄이라는 양면성과 동시성을 작동시켰다. 고통과 혼돈의 강을 서서히 건너가도록 돕는 작은 조각배와 같은 해독제가 되었다. 벌어진 상처의 틈이 흠이 아니라 살아가며 보듬어야 할 긴 호흡이 될 수 있도록 내 곁의 동포에게 손을 내밀어 주길 바라며 2년간의 연재를 마친다. 독자들과 만날 수 있었던 사은의 은혜에 깊이 감사한다.
*그간 연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