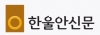며칠 전부터 급작스런 살얼음과 된서리가 내려 추수가 남은 가지, 호박, 고춧잎들이 밤새 안녕이다. 화들짝 놀라 벌써 추운 겨울을 준비하게 한다. 높은 산자락에서부터 차근히 물들이며 가느다란 빗줄기에 무희가 춤을 추듯 빈 허공을 타고 못내 낙엽이 하나둘 내려앉는다.
출발했던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산천초목들의 여행이 시작되고 있다. 가을 정취 사이로 환호와 탄성을 자아내는 인파 속에서도 마지막 한 잎 한 잎은 거침없이 떨구어 버린다.
질퍽한 땅 위에 떨어진 낙엽이 처절하게 자존이 짓밟히고 있다. 죽는다는 것은 만남을 홀연히 버리는 영이별이며 더 이상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무상의 진리 속에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이다. 누가 이 광경 앞에서 욕망의 물거품을 걷어내지 않을 자 있는가? 한때의 드높은 명성과 권력의 힘이란 부질없는 것이다.
형체가 없는 계곡물은 주어진 상황에 온통 내어 맡기며 바위 돌을 굽이 돌아 잠시 머무르기도 하고, 걸림 없이 주르륵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작은 폭포수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우뢰와 같은 큰 소리의 분별도 없고, 단지 주어진 상황 따라 변화의 물결로 흐를 뿐이다.
산책길에서 왼발 오른발의 분명한 알아차림과 집중으로 걷는다. 검붉게 익어 짝 벌어진 틈새로 말간 석류알이 한알 한알 보이듯이 명료하게 의식이 깨어난다. 얼굴에 스치는 바람은 상쾌하고 청량한 이 가을, 산자락을 어루만지며 걸림 없이 자유로운 들숨 날숨은 감미로운 호흡이 되고 만다.
한없이 파랗고 드높은 허공 아래서 어린 아가의 순수한 눈빛과도 같은 이 맑은 거울에 내 마음을 비춰 본다. 삶은 현실이다 보니 일속에서 시비이해의 분별을 놓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파도의 출렁거림을 지켜보며 인욕으로 마장을 걷게 하는 것이 공부라고 마음을 챙겨 본다.
거대한 우주 가운데서 천체가 조화롭게 운행하고 있다. 조직과 집단에 속해 살아가면서 물이 흐르듯 수용하며 서로를 껴안고 가야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각기 다른 업과 습관 그리고 다양한 능력과 가치의 기준 등으로 천차만별의 무량세계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거나 철석같이 굳은 습관으로 절대적인 내 고집을 세워 집착하며 거기에 물들거나 극단에 이를 때가 있다. 싫은 것은 밀어내고 좋은 것은 움켜쥐는 의도 속에서 또 하나의 고통과 업을 부르기도 한다.
아무리 옳다고 고집하는 것도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게 없다. 이 존재마저도 단지 연기로써 존재할 뿐이다. 무아(無我)이기 때문에 무상(無常)한 것이다.
서로를 상생의 기운으로 순화시키고 기다리고 돌리고 부드러운 덕으로 감화시키는 자연의 위력 앞에 나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다. 심은 것을 거두는 이 계절,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늘과 땅과 물과 공기를 주신 보배가 있어 감사할 뿐이다.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때가 성큼 다가왔다. 가마솥 아궁이 앞에서 이글이글 장작불을 지피는 따사로운 훈기로 저항의 파장들을 다 녹아내는 시월의 끝자락이 되기를 염원해본다.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