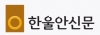서울교구 오덕훈련원 원장
짙은 어둠이 내려와 세상의 만물이 휴식을 취하게 하여 새롭게 하루를 맞이하는 아침은 생명 가진 존재계의 맑고 성스러움이 깃든 곳이다.
동트기 전 이른 아침에 정적을 깨고 청아한 목소리로 하루를 여는 전주곡이 들린다. 허공을 휘감아 뒤흔드는 산골짜기의 메아리 소리는 ‘깍깍~ 뻐꾹~ 짹짹~ 똑 또르르~ 쑥국~’ 귀 기울여 소리에 집중하니 각기 다른 독주가 조화롭고 평화로운 산울림으로 마치 선경의 세상에 초대되는듯한 아침이다.
새들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요란한 낮 시간을 비켜서며 비로소 인적이 끊어진 고요 속에 묻힌 새벽녘에 허공과 산자락이 온전하게 자유로운 품 안이 된다.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은 비어 있는 공간을 통하여 이들의 존재가 드높게 드러나는 향연이 이루어지는 축제의 장이 이루어진다.
봄철에 도량 곳곳에 화초 양귀비 꽃씨를 뿌려 대지 위에 꽃이 피고 있다. 척박한 땅에 뿌려진 씨앗은 작은 키에 외대로 올라와 가냘픈 꽃 한두 송이를 피우고는 존재의 사명을 다하고 이별이다. 그러나 거름을 풍요롭게 온몸으로 받은 꽃나무는 우람하게 자라 여러 줄기의 꽃대를 올려 탐스럽고 우아하게 피어 그 자태를 마음껏 드러내고 있다.
새벽녘 선방 가는 길에 현관 앞에 핀 꽃들과 눈길을 마주하며 인사를 나눈다. 꽃을 감싸고 있는 초록색 껍질이 반쯤 열려 붉은 꽃잎을 물고 있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바라보면 반쯤 남은 껍질마저도 밀어내고, 나머지 꽃잎을 열고 있다. 어느 때는 주저 없이 땅에 슬그머니 꽃잎을 내려놓는 시시각각 변화의 묘미에 즐거이 눈길이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생명을 빚어내는 숭고함을 마주하노라면, 이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다.
우주에는 가슴 뛰는 맥박이 살아 숨 쉬고 있다. 이 주파수에 내 채널을 맞추고 합일하면 인간관계에서 지치거나 어리석은 감성의 출렁거림도 번뇌의 잡철도 심신의 피로도 녹아내리는 자정 작용의 거룩한 힘이 있다.
땅 위에서 그리고 허공에서 일어나는 질서와 법칙은 나를 가르치는 최고의 스승이다. 오묘한 자연의 질서 안에서 주어진 상황 따라 그때그때 변화하고 순리에 따르며 때로는 높게, 때로는 낮게, 때로는 우아한 자태로 때로는 인연이 다하면 바람에 그 이름을 훅 날려 버릴 줄 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물 흐르듯이 부드러움과 자연스러움으로 당하는 순간순간을 맞이하면 상대가 끊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때 하늘에서 천록이 내리며 사람과 돈, 그리고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어지지 않은 것을 더 얻으려고 발버둥 치며 욕망으로 성취하여 오르거나 거머쥐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며 역리로 구하는 것이다. 비가 새는 집에 살면서도 내 공덕이 부족할 뿐, 그 가난을 수용하여 애달파하지 않으면 마음이 부유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은 바람이 아니라 그럴만한 원인의 조건을 성숙하게 하는데 그 비밀이 있다. 그리고 어떤 결과나 상황이 올지라도 멀리, 높게 보아 서두르지 않고 떳떳하고 평온하다. 새들도 꽃도 사람도 조건이 성숙하면 반드시 변화하고, 비어 있으면 그 존재가 있는 그대로 스스로 드러난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새로운 조건 따라 끊임없이 변화할 뿐이다. 이것이 내가 서 있는 존재계이다.
이름과 직책, 명예는 영원할 수 없는 한때의 허상의 세계인 것이며, 그것에 집착하면 자신을 얽어매는 구속인 것이다.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