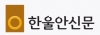“달팽이숲밭이 풀 속에 잠겼다는 것은 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쁘게 풀을 매던 손이 잠시 멈칫한다. 호미에 걸려 지상으로 딸려 나온 바랭이와 괭이밥에 대한 원망심이 단번에 사라지고만 자리, 가만히 흙을 만져본다. 그러고 보니 흙색은 진하고 촉감은 훨씬 보드라워졌다. 허세 조금 넣어 손가락 굵기만 한 지렁이도 스물스물 기어 나온다. 산삼을 발견한 심마니보다 더 기쁜 소리로 외쳤다. “지렁이 봤다.”
지난해 4월 대구 동명훈련원 주차장에 먹을 수 있는 정원 ‘숲밭(forest garden)’을 만들었다. 트랙터로 슬쩍 갈아엎은 주차장이 오직 20명 농부의 삽질로 300평 ‘달팽이숲밭’으로 변신했다. 농부들은 자본의 명령대로 살지 말고, 자연의 명령대로 느리고 짬짬이 쉼이 있는 삶을 살자고 ‘달팽이 숲밭’이라 이름 지었다. 산사나무를 중심 삼아 숲밭 가운데에는 탄지, 히숍, 서양톱풀, 민트 등의 허브를 심었다. 취, 방풍, 곤드레 등 나물류와 박하, 디기탈리스, 카모마일, 바질, 금잔화, 산국, 쐐기풀, 백리향, 라벤더, 감초 등 수십 종의 허브들이 박토를 메웠다. ‘달팽이숲밭’ 주변에는 사과, 배, 포도나무 등으로 만든 20개의 나무길드(나무협동조합)가 둘러치듯 들어섰다.
삽과 호미를 놓고 또다시 바삐 살다 1년 만에 찾은 달팽이 숲밭은 그동안 풀 대궐을 이루며 건강한 땅으로 변신 중이었다. ‘보이는 것’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좁은 소견이었는지 깨닫는다.
기후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와 인류가 큰일 났다며 에어컨에 스카프를 덧 두르며 걱정에 빠진다.
그러나 탄소는 지구와 인류의 적이 아니다. 균형의 문제다. 대기, 바다, 생물권, 흙, 화석 5개 층으로 구성된 지구는 탄소가 지상과 지하를 오가며 조화롭게 상생했다. 땅속에 묻힌 화석을 발견한 인간이 성장과 편리의 욕망을 위해 연료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A4용지와 과도한 육식을 위해 인간들은 나무를 베고 열대우림을 초지로 만들어 대기 중 탄소를 가두었던 흙을 강력한 스콜 한방에 속절없이 바다로 쓸려가게 만들었다. 흙이 흡수하지 못한 탄소까지 흡수한 바다는 빠르게 산성화되었고 바다생물들은 대량멸종을 면치 못했다. ‘성장’을 신격화한 인간들은 탄소 배출을 멈추지 않고 3초에 1개의 생물 종을 사라지게 했다. 스스로도 멸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지렁이가 1cm의 흙을 만드는 데 100년이 걸린다. 흙은 한번 쓸려나가면 복구가 어렵다.
‘달팽이숲밭’ 풀들을 매고 흙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다시 한번 볏짚을 덮었다. 볏짚 멀칭 아래 수분을 머금은 흙은 미생물과 지렁이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한다. 물과 햇빛으로 광합성을 한 식물은 공기 중 탄소를 흡수해 탄수화물로 변환한다. 그것이 바로 설탕, 당이다. 뿌리로 보낸 당분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미생물은 결국 탄소로 건강한 흙을 만들고 저장한다. 자연의 기술은 그저 놀라울 뿐이다.
달팽이형태를 잃어버린 숲밭을 갈아엎고 다시 보기 좋은 정원을 만들자고 훈수를 두던 이들이 볏짚 멀칭을 하고 벽돌로 고랑에 길을 내며 이틀간 ‘달팽이숲밭’ 구하기에 땀을 흘렸다. 이름을 몰라 궁금했던 허브와 나무들에 이름표를 달아주고 이름을 불렀더니 치자, 구기자, 구즈베리, 비타민, 아로니아가 존재를 나타낸다. 지난가을 날아와 터를 잡은 코스모스들도 곳곳에서 흙을 차고 올라온다.
흙이 살아야 나도 산다. 어떻게 농사짓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탄소는 대기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땅에서 건강한 흙을 만들 수도 있다.
‘사느냐, 죽느냐’는 우리 손에 달렸다.

이태은 교도
서울교당.원불교환경연대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