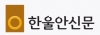오는 8월 31일이면 진밭평화교당에서 기도 한지 2천일이 되는 날이다.
지금은 화, 수, 목요일 일주일에 세 번씩 경찰병력이 소성리로 들어와서 미군에게 통행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경찰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진밭교에서 원불교 교무들이 주저앉아서 철야기도와 농성을 시작한 것은 원불교의 스승이신 정산종사께서 진리를 깨치러 떠났던 구도길을 따라서 순례를 하려던 교무들을 경찰이 막았기 때문이다. 그곳은 군사시설이 되어서 아무에게도 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했었다. 찬서리 맞으면서 꼿꼿이 앉은 자세로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교무들은 진밭교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진밭교에는 원불교 교무와 교도 그리고 소성리, 성주, 김천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비닐 한 장에 의지해서 시작한 기도는 천막을 치고 원불교 평화교당을 세웠다.

기도한 지 2천일 만큼 수많은 대중이 진밭평화교당에 모여들었지만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다.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사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소성리 김의선, 노옥, 권정술, 장경순 할머니들은 “사드는 뽑아주고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지금은 소성리 밤하늘의 별이 되었다. 할머니들 곁에서 순하디순하게 웃고 있던 현철이는 사드기지를 바라보고 자란 소나무가 되었다.
나는 원불교에 입교했다.
2019년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치열했던 싸움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소성리가 조금 조용해질 즈음이었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미군 숙소까지 산길을 걸었다. 사드-미군기지 철조망 둘레길에서 미군 숙소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산길을 걸어서 올라갔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자락에 병풍처럼 흐드러지게 피었던 기억이 난다. 노란 생강나무꽃이 예뻤다. 냇물이 졸졸 흘렀고 산은 물을 머금고 있어 촉촉하고 폭식 폭신했었다.
미군 숙소 앞에서 미군을 향해서 외쳤다. “사드 갖고 너희 땅 미국으로 떠나라”고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 들을까 봐 영어문장을 적어와서 더듬더듬 읽기도 했었다. 미군 숙소에는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이 있었다. 셰퍼드(개)를 데리고 나와서 구경하는 미군을 보기도 했었다. 한국군인이 총을 메고 우리 앞에 나타난 적도 있었다. 또 내려가는 길은 미끄러워서 한겨울에는 엉덩방아를 여러 번 찧었던 기억이 난다. 많은 사람이 걸었던 게 아니라 해봐야 고작 둘 아니면 셋이서 미군 숙소로 올랐었다.
강현욱 교무님을 따라서 푹신한 산길을 걷다가 문득 원불교에 입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울창한 나무 그늘이 볕을 피하게 해주었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오르막길을 걸어도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아서 신선했다. 커다란 나무가 그늘도 크게 만들어주었다. 나를 이끌어주고 내게 그늘이 되어줄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강 교무님이 홀로 외롭게 미군 숙소로 올라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사드 반대하는 싸움이 고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한발 한발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동지로 곁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했었다. 그러다, 불쑥 원불교에 입교하고 싶다는 말을 건넸다.

원불교에 입교하고 나서 한겨울 깜깜한 밤에 눈발이 휘날리는 진밭교에서 심고를 올린 적이 있었다. 달마산을 향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두 손을 합장하고 김선명 교무님이 두드려주는 목탁 소리에 맞춰서 고개를 숙였다. 달마산을 바라보면서 아무 소원도 빌지 않았다. 사드를 뽑게 해달라는 말도, 철조망을 거둬달라는 말도, 그저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숙연해지고 내 몸에 평화가 깃들 것 같은 신령스러운 기운을 받으면서 두 손을 합장하고 두 눈을 꼭 감은 채 목탁 소리에 몸을 의지했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김 교무님은 평화교당에서 기도를 올렸다. 밤하늘엔 늘 북두칠성이 빛나고 있었다. 진밭에는 평화교당이 있고, 평화교당에는 기도하는 원불교가 있었다. 소성리 주민들은 진밭평화교당에서 김 교무님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교무님의 기도는 북두칠성과 같아서 늘 한결같이 소성리 마을을 비춰주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나는 김 교무님께 아둔하게 질문을 했었다. 진밭으로 오를 때마다 한번도 흔들리지 않았냐고 물었다. 김 교무님은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고 내게 말씀해 주었다.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늘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다.
진밭을 지켜주던 김 교무님은 지난해 대중의 총의를 받들어 원불교 교단의 수위단원에 오르셨고 영광교구로 길을 떠나셨다. 교무님이 가신 후에도 그리움은 깊어져서 진밭에서 소성리 마을을 환하게 비춰주었던 기도가 무엇인가 흔적을 찾아보았다.
기도는 계교하지 않는 것임을….
다만 진리요,
정의요,
평화의 길임을 믿기에
오늘도 그저
뚜벅뚜벅 그 길을 갈 뿐….
법신불 사은이시여!
"기도는 계교하지 않는 것임을 다만 진리요, 정의요, 평화의 길임을 믿기에, 오늘 그저 뚜벅뚜벅 그 길을 갈 뿐….” 이라는 김 교무님의 육성으로 듣지 못했던 기도문을 읽고서야 내 의심은 거둬졌다. 기도도, 운동도, 투쟁도, 계교하지 않는 것임을 김 교무님이 떠나고 나서야 내 가슴에 깊이 새겨두었다.
싸움은 길어지고 소성리 주민들은 연로해져 우리는 점점 소수가 되었다.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는 처지가 되어 기도라도 해서 사드를 뽑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목탁 소리에 몸을 의지하고 소리를 내 영주를 외운다.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마저도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한겨울 눈발이 날리는 진밭교에서 달마산을 마주할 때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저 숙연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와 정의와 평화의 길을 걷겠다는 다짐의 기도가 되면 좋겠다. 2천일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않고 그저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듯 기도가 그리하였으면 좋겠다.

오늘은 소성리평화행동을 마치고 진밭평화교당을 올라가 보았다. 집회 장소를 조용히 빠져나와서 걸었다. 평화교당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소성리 마을길에서 기도한다.